기획단계까지 포함하면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프로젝트가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회사일을 하며 짬짬이 인터뷰를 촬영해 유투브에 취미 삼아 영상을 올리자는 생각이 어쩌다 다큐멘터리 제작이 되었다(이 두 구간 사이의 로직 점프는 지금 생각해도 미스테리다. 내가 어쩌자고 그랬을까). 후반 작업도 그냥 혼자서 대강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했었는데, 과분할 정도로 프로인 분들과 팀을 꾸려 진행하게 되었다.
Before 후반작업
촬영 기간 동안 힘든 순간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크라우드 펀딩 역시도 만만한 일은 아니었고, 섭외는 오히려 생각보다 너무 잘 풀려서 얼떨떨했던 케이스다.
촬영은 총 25개 도시에서, 68여 명의 인터뷰이와 함께 이뤄졌다. 이 중 최종 필름에 피쳐된 인터뷰이는 약 40명 정도. 촬영 당시 체력적으로 지칠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을 때는 동남아 지역에서 땡볕에 삼각대, 모노팟, 반사판, 마이크 2개, 카메라 2개 짊어지고 다니면서 야외 촬영했을 때/아이슬란드에서 한숨도 제대로 못 자고 덜덜 떨면서 일주일 연속으로 강행군 촬영했을 때 정도일 거다.
원격으로 다른 도시에서의 촬영을 도와준 이들 덕에, 그나마 훨씬 덜 고생하고 진행할 수 있었다. 마뉴엘과 마리나는 실리콘밸리 촬영의 상당부분을 맡아 진행해주었고, 마뉴엘은 독일부터 아이슬랜드까지 여러 곳에서 촬영본을 보내왔다.
다큐멘터리에 사용된 전체 샷의 약 60~70%는 내 카메라에서, 나머지는 독일, 태국, 브라질 등 전세계 각지에서 전달되었다. 이들 중 나와 실제로 함께 현장에서 촬영 작업을 해본 건 마뉴엘이 유일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스카이프로는 시도때도 없이 봤지만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

인터뷰 자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재밌어서, 촬영 과정을 잘 즐길 수 있었던 것 같다. 인터뷰 과정에서 나 개인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부분도 많았다. 인터뷰 샷만 카운트해도 48시간 하고도 좀 더 되니까, 거의 50시간에 육박하는 이야기를 들은 셈이다.
이걸 몇번씩 거듭 돌려보면서 총 10시간 정도로 간추리고, 영상 내용을 텍스트로 정리하는 트랜스크립션 작업(트랜스크립션은 모두 Rev에 맡겼다. 정확도에서 속도까지 최고, 최고 최고)을 하니 거의 책 한 권 분량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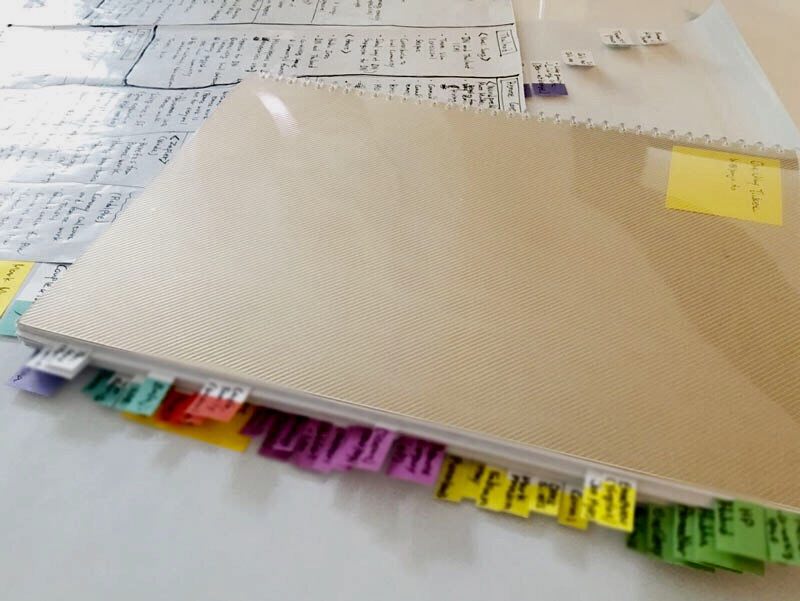
이 모두를 하나의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한 시간 남짓으로 줄여야만 했다는 게 안타깝고 아깝기도 했는데, 고르고 그 중에서 또 고르는 과정을 거듭하면서 더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이 자못 신기하기도 했다.
후반작업을 얕본 내가 바보였다
2015년 초, 내가 예상한 완성 시점은 2016년 상반기였다. 2015년 1년 동안 촬영을 마무리하고, 후반작업이야 뭐 한 두세달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 했던 내가 얼마나 바보였던지 지금 생각하면 참..
촬영 단계에서 ‘후반 작업이 그 전까지의 작업들보다 훨씬 더, 몇 배는 더 어렵다’라는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왜 난 대수롭지 않게 듣고 넘겼던 걸까. 내 경우 후반작업은 더 오래, 그리고 생각보다 더, 그 이전 단계보다 족히 열 배는 더 어렵게 느껴졌다. 후반작업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해야 했기에 그랬고, 프로듀서 없이 나 혼자 제작에 필요한 모든 자잘한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맡아 해야 했기에 더욱 그러했다(프로듀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번 제작 과정 전체에서 내가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촬영이 완료된 후엔 시나리오 빌딩이 우선 과제였다. 트랜스크립션을 거듭 읽으며 문장 단위로 사용할 부분들을 고르고, 그와 동시에 시나리오 작업이 시작되었다. 기존 시나리오는 촬영이 진행되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배우고 알게 되면서 대폭 수정되었다. 이 작업을 2016년 봄, 여름 제주와 암스테르담 등지에서 계속했다. 시나리오 작업 당시에는 이미 촬영 중반 단계 즈음에 일찌감치 동이 난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3개월 정도 일을 하기도 했다.
이 때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조시아로, 런던에서 지내고 있는 내 시나리오 작가였다. 조시아는 휴가 차 머물렀던 발리와 주로 거주하고 있는 런던에서, 나는 제주와 암스테르담에서 스카이프와 구글 문서를 이용해 함께 일했다. 시나리오 빌딩 단계에서 특히 까다로웠던 부분이 바로 디지털 노마디즘에서 야기되는 여러 문제점 등을 과연 어디까지, 어느 정도로 깊게 가져갈 것인가와 같은 부분이었다.
실존하지 않는 환상팔이로 돈을 버는 이들, 탈세, 현존하는 비자 제도의 악용 같은 부분과 네오-콜로니얼리즘, 즉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는 아닌지(몇몇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자주 관찰되는, 협업 공간 등지에서 현지인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는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까지, 조시아의 도움으로 적절한 선에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다.
끊임없이 의견을 교환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팀원이 있다는 사실은 큰 버팀목이었다. 동고동락하는 시간을 통해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조시아 역시 아직껏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 굳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시간쓰고 돈 써가며 이동을 하지 않아도, 원격으로도 얼마든지 협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확인 시켜준 이들 중 한 명이 바로 조시아다.

계획 수정, 슈퍼 에디터님 출현
본디 계획은 내 아마추어 수준의 프리미어 스킬로 손수 편집하는 거였다. 쇼트도 아닌 피쳐 길이의 다큐멘터리를 내가 구글을 벗삼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는 거였다. 아마추어리즘의 절정을 보여주마!라는 심산이었는데, 어쩌다 잭팟이 터져 훌륭한 인터뷰이들을 모셔다 놓고 촬영하고 나니 내가 아무리 얼굴이 두꺼워도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더라. 마침 촬영이 끝나고 잠시 일을 했던 덕에 전체 일정은 딜레이 되었지만 후반 작업에 쓸 비용이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였다.
인터뷰의 대부분이 영어로 진행되었기에 단순히 영어를 이해하는 정도가 아닌,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매끄럽게 다듬을 수 있는 편집자를 구해야 했다.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등지에서 친구를 통해 사람을 찾아보는 거였는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오히려 동유럽쪽에서 프로젝트에 흥미를 가지고 에디터로 조인하고 싶다는 연락이 종종 오곤 했는데, 처음으로 다큐를 제작하는 햇병아리 감독이니만큼 편집자는 어느 정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찾다보니 이것도 번번히 무산되었다. 그러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홀연히 나타난 귀인이 있었으니 바로 김우석 편집자였다.
영화를 전공한 친구의 소개로 연락처를 받은 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우석님을 만난 것이 지난해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던 때였다. 제주에서 이틀에 걸쳐 전체 히스토리와 진행 방향 등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촬영본이 든 하드 드라이브를 교환한 후 나는 암스테르담으로, 우석님은 서울로 각자 날아가서 스카이프를 통해 작업을 진행했다. 가을부터는 서울에서 스카이프와 현장 협업을 병행하며 함께 후반 작업을 마무리했는데, 우석님은 생판 초짜인 나를 대신해 후반 작업 전체를 꼼꼼히 챙겨주셨다. 우석님이 없었으면 아마 완성 자체가 불가능했을거다.




